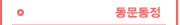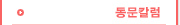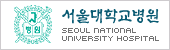주요 학회 이사장·회장도 '서울의대 장악'
페이지 정보

본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 의대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기존 의대별 ‘격차 좁히기’는 아직까지는 소원한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과 ‘학술’이라는 큰 맥락에서 의료계를 ‘병원’과 ‘학회’로 구분했을 때 이 조직과 단체의 수장들은 여전히 유명 의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각 의대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데일리메디는 전국 대학병원 병원장 및 주요 학회 이사장과 회장 현황을 살펴봤다.(기사에서는 이사장과 회장 체제 구분없이 일괄 회장으로 통일함)[편집자주]
서울의대 출신들이 병원계와 학술 '양대산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일리메디가 10일 42개 주요 학회 이사장 및 회장들의 연령·출신학교·전공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대 출신은 17명(24.7%)으로 앞서 조사 발표된 병원장에 이어 주요 학회 이사장 및 회장에 대거 포진돼 있었다.
특히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 3개 대학 출신이 70%를 넘는 등 대학서열에 따른 장악 구조가 학회 안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저변이
두터운 전남의대(4명), 영남의대(3명) 출신 등도 상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학회 수장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실제로 42개 주요 학회 중 연세의대 출신 회장이 8명으로 전체 19.0%를 차지했고, 가톨릭의대 출신은 4명(9.5%)으로 그 뒤를 이어 수도권 편중 현상을 방증했다.
여기에는 학회의 지역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분포에 대해 서울의대 출신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바로 전통과 의료진의 우수한 실력이다.
서울의대 출신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차영주(서울의대) 교수는 10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임상은 물론 학술 연구 분야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울의대는 인적자원이 우수해 의료계 어느 곳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출신들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내 의대 출신들 사이의 수준차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 "학회장이 단지 한 학교 출신에 쏠려 있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인맥'이 작용할 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 발전의 큰 주축을 형성해 오고 있는 학술대회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학회 중집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현 의료계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이러한 자생력의 기반에는 학술대회의 활발한 활동이 밑받침됐다는 주장.
학술 및 학회의 중요성과 이를 전문화하고, 특수화할 수 있는 학회 수장의 역할이 드러나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10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심포지움과 임상강좌 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개원회원이나 수련의들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의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학회장의 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에 집중돼 있어 병원장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한의사학회 이부영 회장이 1932년생으로 최고령,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양실 회장이 1935년생으로 노익장을 과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