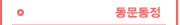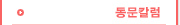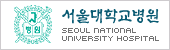- [Editor's Note] 서울대에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 [Editor's Note] 서울대에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
<주간 - 170> 2003-05-19
원로작가 박완서 선생이 근자에 펴낸 산문집 「두부」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남편은 그런 약들을 싫어했다. 그는 내가 구해온 진귀한 약을 거부하면서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노벨상감인데 왜 아직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냐고 했고, 나는 당신이 얼른 먹고 나아서 그 사람 노벨상 받게 합시다, 라고 맞서곤 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말다툼이자 마지막 농담이었다. (중략) 나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약을 샀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약을 거부했다. 나는 한 꾀를 내어 병원에서 준 약을 캡슐에서 쏟아버리고 대신 그 약을 채워서 복용토록 했다. 어둑신한 방구석에서 죄짓듯 마음을 졸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짓을 한 나는 그럼 그 약을 믿었을까. 안 믿었던 것 같다. 그저 후회나 안 하자고, 하는 데까지 다 해보자고 한 짓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그를 위한 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이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병원에서 그런 사기를 쳤더라면 당장 고소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약이나 민간요법은 속고 나면 그뿐이고 뒤끝이 없다. 그게 도리어 생약이나 민간요법의 정당한 발전을 저해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기꾼이 끼여들 수 있는 허점이 되고 있는 거나 아닌지.>
이 글을 좀 길게 인용한 것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 논란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은 한의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의사를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사기꾼과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대에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위의 글이 떠올랐다. 아마도 ‘노벨상’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게다. ‘도대체 왜 한의사 중에 노벨상 받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는 나도 절실히 바라는 바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자들이 노벨상도 여럿 탔으면 좋겠고, 한약을 현대화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의 제약 시장을 석권했으면 좋겠고, 세계 각지의 난치병 환자들이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로 몰려들었으면 좋겠고, 한의학 덕분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세계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묻고 싶다.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언어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한의과대학과 흡사한(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이라 해봐야 결국 교수진은 다른 한의과대학에서 초빙할 수밖에 없다) 곳을 한 군데 더 만드는 것으로는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부정해서나 ‘밥그릇’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제안한다.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이 아니라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고.
지금 한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많은 한의사들은 과잉공급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한의사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가 목적인 것이니, ‘교육기관’보다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 일이다.
서울대학교에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 그곳에 의사와 한의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라.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 기준에 맞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다. 필요하다면 외국에서도 인재를 불러와라. 그리하여, 한의학의 여러 치료방법과 약제들의 옥석을 가려라. 그리고 제발 노벨상 좀 받아라. 그래야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안 아깝지 않겠는가.
박재영 편집국장 medicaljournalist@
<주간 - 170> 2003-05-19
원로작가 박완서 선생이 근자에 펴낸 산문집 「두부」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남편은 그런 약들을 싫어했다. 그는 내가 구해온 진귀한 약을 거부하면서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노벨상감인데 왜 아직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냐고 했고, 나는 당신이 얼른 먹고 나아서 그 사람 노벨상 받게 합시다, 라고 맞서곤 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말다툼이자 마지막 농담이었다. (중략) 나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약을 샀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약을 거부했다. 나는 한 꾀를 내어 병원에서 준 약을 캡슐에서 쏟아버리고 대신 그 약을 채워서 복용토록 했다. 어둑신한 방구석에서 죄짓듯 마음을 졸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짓을 한 나는 그럼 그 약을 믿었을까. 안 믿었던 것 같다. 그저 후회나 안 하자고, 하는 데까지 다 해보자고 한 짓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그를 위한 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이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병원에서 그런 사기를 쳤더라면 당장 고소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약이나 민간요법은 속고 나면 그뿐이고 뒤끝이 없다. 그게 도리어 생약이나 민간요법의 정당한 발전을 저해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기꾼이 끼여들 수 있는 허점이 되고 있는 거나 아닌지.>
이 글을 좀 길게 인용한 것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 논란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은 한의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의사를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사기꾼과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대에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위의 글이 떠올랐다. 아마도 ‘노벨상’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게다. ‘도대체 왜 한의사 중에 노벨상 받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는 나도 절실히 바라는 바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자들이 노벨상도 여럿 탔으면 좋겠고, 한약을 현대화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의 제약 시장을 석권했으면 좋겠고, 세계 각지의 난치병 환자들이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로 몰려들었으면 좋겠고, 한의학 덕분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세계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묻고 싶다.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언어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한의과대학과 흡사한(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이라 해봐야 결국 교수진은 다른 한의과대학에서 초빙할 수밖에 없다) 곳을 한 군데 더 만드는 것으로는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부정해서나 ‘밥그릇’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제안한다.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이 아니라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고.
지금 한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많은 한의사들은 과잉공급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한의사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가 목적인 것이니, ‘교육기관’보다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 일이다.
서울대학교에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하라. 그곳에 의사와 한의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라.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 기준에 맞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다. 필요하다면 외국에서도 인재를 불러와라. 그리하여, 한의학의 여러 치료방법과 약제들의 옥석을 가려라. 그리고 제발 노벨상 좀 받아라. 그래야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안 아깝지 않겠는가.
박재영 편집국장 medicaljournali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