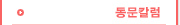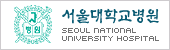[청년의사]에 게재된 우리 의국 소개 기사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우리 의국을 자랑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주간 - 145> 2002-11-18
딱 부러지게~ 똑 떨어지게~
‘dramatic’이라는 단어에는 ‘극적인’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박진감 넘치는’, ‘매우 인상적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국원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다면, ‘dramatic’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기다란 흰 가운을 ‘휘날리며’ 질풍노도(?)처럼 ‘우르르’ 나타난 점도 그렇고, 묻는 말마다 ‘딱’ 부러지게 답을 내어주는 시원시원함도 그랬으며, 짧은 시간 동안 수술장과 병동을 ‘휘몰아치면서’ 사진촬영과 인터뷰에 응해주는 엄청나게 재빠른 행동거지 또한 그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국원들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현장.
젠틀맨, 쫄바지 차력 시범을 하다!
예상했던 대로 의국 자랑 또한 범상치 않았다. 이들이 시원시원하게 풀어놓는 의국 자랑, ‘우리가 남과 다른 점’들을 들어보자.
“보셨겠지만 저희가 성격이 좀 급하죠.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두루뭉실한 거 못 참고,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늘 서두르고 뛰어다니고…. 알고 보면 정신없는 의사들입니다. 하하.”
너스레를 떨듯 말하지만 3년차 이상림 전공의의 이 말은 ‘사실’이다. 30명의 정형외과 전공의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식당에 가서도 밥이 빨리 안 나오면 주인아줌마를 불러 ‘왜 밥이 늦게 나오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를 따지는 게 정형외과의 정형화(?)된 모습이라니 말이다.
“절도 있고 질서 있죠. 진짜예요. 저희 의국에서는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 말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심지어 물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순서가 있답니다.”
과장이 아니라, 빼곡하게 들어찬 엘리베이터에서도 교수님이 내리실 차례가 되자 이들은 홍해처럼 반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교수님이 내리신 뒤 비교적(?) 연차별로 순서대로 내리는 정연한 모습을 기자에게 보여줬더랬다.
“젠틀하죠. 복장도 정장차림으로 깔끔하게, 1년차들은 가운 속에도 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젠틀’한 정형외과 의국원들도 망가질 때는 확실히 망가진다. 지난 망년회 때만해도 2년차 박루뽀 전공의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쫄바지와 치마차림으로 ‘초등학생 옷 입기’라는 엽기적인 차력시범까지 선보이지 않았던가.
시체와 함께 탱고를 추다!
다음은 현재 의국장을 맡고 계신 조태준 교수님이 꼽아주신 정형외과의 매력 두 가지∼.
“환자에게 확실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질질 끌지 않고 병이 뚝 떨어지거든요. 일단 나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치료전후의 환자의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이죠. 각과에서 다루는 신체조직을 무게로 재보면 말이죠, 저희 정형외과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척추부터 시작해서 온 신체를 다 다루지만, 사실 심장내과는 심장 하나, 호흡기내과는 폐 하나밖에 안 되잖습니까. 하하.”
그래서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 중 해부학 공부는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되어있다. 그리고 그 덕에 모든 정형외과 의국원들은 1년차 때 일명 ‘시체와 함께 탱고를 춘’ 뼈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단다.
“시체 해부실에 가서 밤새도록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번은 공부하던 시체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들어올리다가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침 팔다리도 없이 몸통과 머리만 있는 시체더라구요. 그런데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오데요. 물론 무겁기도 했지만요. 하하. 심지어 다음날 눈떠보면 같이 누워서 잠들어 있던 적도 많았어요.”
이렇게 3년차 유재호 전공의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자 다들 ‘난 팔다리도 다 있는 시신이었어’ 등의 우스개 말을 툭툭 건넨다. 그러면서도 눈빛으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끈끈하고 은밀한 동료애를 주고받고 있었다.
최대의 실수 최고의 성공!
“아, 자랑거리 한가지 더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중도하차하고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처음 오면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가장 큰 실수는 의사가 된 것이요, 가장 큰 성공은 정형외과에 온 것이다’. 전 지금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짐하듯 말을 마치는 3년차 전공의, 그리고 그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있는 1년차 전공의들. 이제 갓 1년을 보낸 1년차들의 느낌은 어떨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군대보다 엄격하다 어떻다 하면서 어찌나 소문이 무성한지…, 겁을 좀 먹었었죠. 와보니까(잠시 둘러보며 ‘피식’ 웃음) 의국 분위기는 소문보다 좋은 것 같구요. 물론 아직 1년차긴 하지만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는 조금 안정이 됐지만요.”
문득 엘리베이터 안에서 3년차 이상림 전공의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의사들은 다 똑같다고들 하죠? 말투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정형외과 의사는 특히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 의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정형외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의대에 처음 들어올 때처럼 정형외과에 처음 들어올 때는 다들 다른 성격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정형외과 의사에 적합한 성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점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가는 거죠.”
딱 부러지는 성격만큼이나 정형외과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정형외과 의사로 완성되는 그 날을 상상해본다.■
<주간 - 145> 2002-11-18
딱 부러지게~ 똑 떨어지게~
‘dramatic’이라는 단어에는 ‘극적인’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박진감 넘치는’, ‘매우 인상적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국원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다면, ‘dramatic’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기다란 흰 가운을 ‘휘날리며’ 질풍노도(?)처럼 ‘우르르’ 나타난 점도 그렇고, 묻는 말마다 ‘딱’ 부러지게 답을 내어주는 시원시원함도 그랬으며, 짧은 시간 동안 수술장과 병동을 ‘휘몰아치면서’ 사진촬영과 인터뷰에 응해주는 엄청나게 재빠른 행동거지 또한 그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국원들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현장.
젠틀맨, 쫄바지 차력 시범을 하다!
예상했던 대로 의국 자랑 또한 범상치 않았다. 이들이 시원시원하게 풀어놓는 의국 자랑, ‘우리가 남과 다른 점’들을 들어보자.
“보셨겠지만 저희가 성격이 좀 급하죠.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두루뭉실한 거 못 참고,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늘 서두르고 뛰어다니고…. 알고 보면 정신없는 의사들입니다. 하하.”
너스레를 떨듯 말하지만 3년차 이상림 전공의의 이 말은 ‘사실’이다. 30명의 정형외과 전공의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식당에 가서도 밥이 빨리 안 나오면 주인아줌마를 불러 ‘왜 밥이 늦게 나오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를 따지는 게 정형외과의 정형화(?)된 모습이라니 말이다.
“절도 있고 질서 있죠. 진짜예요. 저희 의국에서는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 말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심지어 물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순서가 있답니다.”
과장이 아니라, 빼곡하게 들어찬 엘리베이터에서도 교수님이 내리실 차례가 되자 이들은 홍해처럼 반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교수님이 내리신 뒤 비교적(?) 연차별로 순서대로 내리는 정연한 모습을 기자에게 보여줬더랬다.
“젠틀하죠. 복장도 정장차림으로 깔끔하게, 1년차들은 가운 속에도 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젠틀’한 정형외과 의국원들도 망가질 때는 확실히 망가진다. 지난 망년회 때만해도 2년차 박루뽀 전공의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쫄바지와 치마차림으로 ‘초등학생 옷 입기’라는 엽기적인 차력시범까지 선보이지 않았던가.
시체와 함께 탱고를 추다!
다음은 현재 의국장을 맡고 계신 조태준 교수님이 꼽아주신 정형외과의 매력 두 가지∼.
“환자에게 확실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질질 끌지 않고 병이 뚝 떨어지거든요. 일단 나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치료전후의 환자의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이죠. 각과에서 다루는 신체조직을 무게로 재보면 말이죠, 저희 정형외과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척추부터 시작해서 온 신체를 다 다루지만, 사실 심장내과는 심장 하나, 호흡기내과는 폐 하나밖에 안 되잖습니까. 하하.”
그래서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 중 해부학 공부는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되어있다. 그리고 그 덕에 모든 정형외과 의국원들은 1년차 때 일명 ‘시체와 함께 탱고를 춘’ 뼈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단다.
“시체 해부실에 가서 밤새도록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번은 공부하던 시체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들어올리다가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침 팔다리도 없이 몸통과 머리만 있는 시체더라구요. 그런데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오데요. 물론 무겁기도 했지만요. 하하. 심지어 다음날 눈떠보면 같이 누워서 잠들어 있던 적도 많았어요.”
이렇게 3년차 유재호 전공의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자 다들 ‘난 팔다리도 다 있는 시신이었어’ 등의 우스개 말을 툭툭 건넨다. 그러면서도 눈빛으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끈끈하고 은밀한 동료애를 주고받고 있었다.
최대의 실수 최고의 성공!
“아, 자랑거리 한가지 더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중도하차하고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처음 오면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가장 큰 실수는 의사가 된 것이요, 가장 큰 성공은 정형외과에 온 것이다’. 전 지금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짐하듯 말을 마치는 3년차 전공의, 그리고 그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있는 1년차 전공의들. 이제 갓 1년을 보낸 1년차들의 느낌은 어떨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군대보다 엄격하다 어떻다 하면서 어찌나 소문이 무성한지…, 겁을 좀 먹었었죠. 와보니까(잠시 둘러보며 ‘피식’ 웃음) 의국 분위기는 소문보다 좋은 것 같구요. 물론 아직 1년차긴 하지만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는 조금 안정이 됐지만요.”
문득 엘리베이터 안에서 3년차 이상림 전공의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의사들은 다 똑같다고들 하죠? 말투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정형외과 의사는 특히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 의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정형외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의대에 처음 들어올 때처럼 정형외과에 처음 들어올 때는 다들 다른 성격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정형외과 의사에 적합한 성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점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가는 거죠.”
딱 부러지는 성격만큼이나 정형외과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정형외과 의사로 완성되는 그 날을 상상해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